꿈을 전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나의 미래를 계획해 보세요.
본문
꿈을 전하는 사람들
[직업인] <인터뷰1> 동화작가 황선미
“커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다 할 수 있나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무엇을 해야 하죠?"
궁금한 것 많은 초등학생들을 위해, 스쿨잼이 친구들의 질문을 '직접' 전달해드립니다.
꿈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한 걸음, 스쿨잼 직업 인터뷰.
쨈터뷰가 만난 네 번째 주인공!
<마당을 나온 암탉>, <나쁜 어린이 표>의 저자 동화작가 황선미 님입니다!


처음엔 동화를 쓰는 것이 ‘직업’이 되었다는 걸 사실 못 느꼈어요.
우리가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문학 소년·소녀의 단계를 거치잖아요.
하지만 출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 직업 개념이 생기기는 어려웠어요.
직업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결정 해야 하는 일인데, 1년에 100만원을 벌었다고
'직업'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느껴져야 직업인 거지.
제가 데뷔는 1995년에 했지만, 무명 시절이 길었어요. 2000년부터 책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
황선미라는 작가의 이름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것도 그때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책을 4권이나 냈지만 수입이 없었거든요. 그 때는 스스로도
작가가 책을 팔아서 수익을 가진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책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실 <나쁜 어린이 표>가 작가라는 책임감, 또 글 쓴다는 것에 대한 '자세'를 갖게 해줬어요.

<나쁜 어린이 표>을 읽고 쓴 어떤 어린이의 독후감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책의 주인공보다 더 슬프고 가슴이 아픈 내용이었어요.
내 책을 읽고 어떤 아이가 이렇게 힘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함부로 써서도 안 되는 거고, ‘책이라는 것이 삶의 환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죠.
그 6학년 학생의 독후감을 읽고, 작가로서의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꼭 동화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글을 쓰고 싶어 했고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 되는 건 행운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좋아하는 것과 꿈꾸는 것,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가담을 해서
거기에서 역할자가 되는 건 굉장히 다른 일이잖아요.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어른으로서의 역할도 있어야 하고, 글을 쓰는 작가로서의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 하나를 담당하는 사람이 됐더라구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고마워요.
'내가 이걸 해서 행복해' 이런 것 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른으로서, 사회적 역할까지 담당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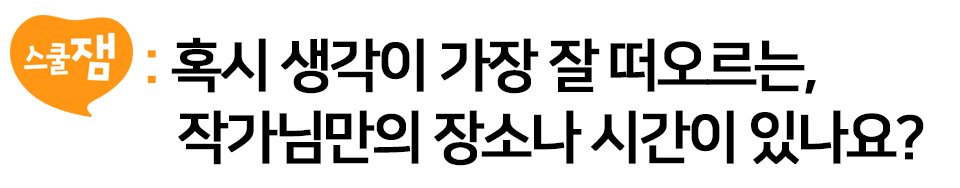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다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칠성이>가 언뜻 떠오른 것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인데, 그 텔레비전이라는 게 ‘늘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재가 생겼다는 거니까 일상이 다 창구인 거죠.


텔레비전에서 무심코 소싸움하는 장면을 봤어요.
소의 얼굴, 신경전을 하고 있는 얼굴을 딱 잡았는데, 그때 소의 눈을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소싸움이란 건 스페인의 투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소의 생김새도 다르지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스페인의 투우 소들은 팔팔 뛰고 역동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소들은, 엄청 커요. 등이 되게 길고요.
그리고 되게 미련하게 약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표정 같은 게 보였어요.
소들이 싸우는 걸 보는데, 사람이 몸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렇게 예쁜 눈을 가지고 있는 소가 어떤 내부적 갈망 때문에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자 순간 소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진주 소싸움 취재를 갔죠.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훈련시키는 전문가와 인터뷰도 했어요.
어떤 훈련 과정을 겪는지, 뿔의 종류에 따라 어떤 기술을 걸 수 있는지, 용어들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공간을 이동해가며 우사도 보고, 경기장도 보면서요.

그리고 소싸움 경기도 보러 갔는데, 경기를 하는 곳과 관중석 사이가 너무 멀어
소의 표정을 보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투우처럼 역동적인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쟤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작정을 하고, 다큐 동영상들을 정말 1번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EBS에서도 소에 관한 영상이 있으면 다 찾아보고 하면서, 도움을 받았어요.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뒤로 갈 수록 상태가 안 좋거나 지워진 영상들도 많고.
그렇게 혼자 했던 노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조합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썼어요.
<칠성이>는 꼭 그림책으로 구성하고 싶었는데요.
그림책은 원래 굉장히 글이 짧고, 이미지가 많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이 많고, 또 덜어낼 글이 없었던 <칠성이>를
그림책으로 구성하려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장이 변한 거예요. 옛날엔 그림책이 미취학 아동들이 보는 콘텐츠로만
여겨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들도 볼 수 있는 그림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영상과 화가가 상상해낸 것이 얼마나 비슷할지 빨리 보고 싶어요.
<마당을 나온 암탉> 때는 작업하는 게 지금 같지 않아서,
책이 나오기 전에 그림을 흑백으로 딱 한번 받아봤었어요.
그리고 책이 나와서 출간 기념 사인을 하러 갔을 때, 그때 저도 책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저는 사인 하나 해주고, 책상 밑에서 그림을 막 구경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화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떤 걸 상상했을까 하는 건 항상 굉장히 궁금하죠.


6학년 때인데요? (웃음) 요즘 어린 친구들도 그 기질이 있는 아이들은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걸 읽으면 재밌는 걸 자기도 쓰고 싶어서 몸살이 나요. 그리고 흉내를 내는 거죠.
저는 그것도 첫 작업이라고 봐요.
뭘 보면서 따라도 해보고, 비슷하게 흉내 내보고 하면서 배우고 연습하는 거죠.
첫 동화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유치한 얘기죠.
'난 이 집의 딸이 아니고, 언젠가 잃어버렸던 엄마 아빠가 날 찾으러 올 거야-'
어디 되게 옛날 이야기에 나올 것 같은, 신데렐라처럼 이상한 상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난 비록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원랜 귀한 애였어', 이런 유치한 글을 썼었어요.

책을 읽기 전에는 여러 번 바뀌었어요. 경찰도 되고 싶었고, 군인도 되고 싶었고,
선생님, 비밀 형사, 간호사- 이런 것들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 6학년 때 동화책을 처음 만났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죠.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그렇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때부터 흉내 내기를 했던 건데요.
그냥, '작가'가 되고 싶다기 보다 평생 책 읽고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동화’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용어를 모르죠. 작가라는 말도 몰랐어요.
"나도 그냥 이런 재밌는 얘기 쓰면서 평생 책이나 읽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글쎄요. 그것도 어른들의 기준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읽고 싶은 걸 보세요. 자기의 시선을 잡는 글이 있으면 일단 읽어보고,
너무 어려우면 나중에 보고, 재밌으면 계속 보고. 또 유치하면 유치한 대로
생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책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말 닥치는 대로 책을 봤고요.
그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진 못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된 거죠.
그리고 책을 추천해주면, 어른들은 꼭 아이들이 그 추천대로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게 또 부담스럽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걱정이 돼요.
출처 스쿨잼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721550&memberNo=34921815&searchRank=32
기획/제작 : EBS 스쿨잼 김지선


